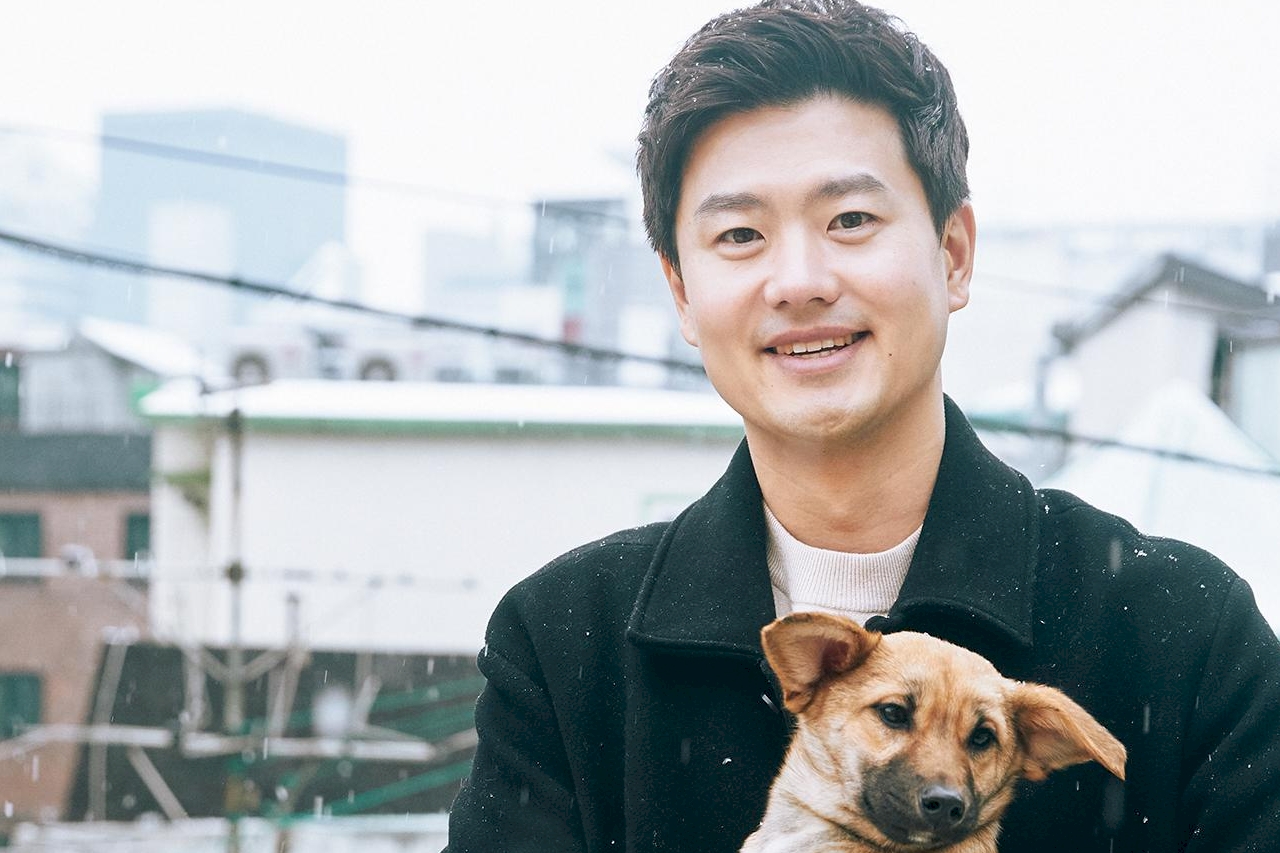© pixabay
H 님이 내가 일하는 일시보호시설에 다시 왔다. 길거리 노숙 상황에서 밤에는 서울역 옆 노숙인 현장지원센터 한 켠의 응급구호방을 이용했다는데, 그녀를 연계한 지원센터 실무자가 H 님이 일시보호시설 이용 경험이 있다고 해서 기록을 뒤져보게 되었고 한다. 2016년에 한 달쯤 시설을 이용한 여성이었다. 꽤 오래전, 짧은 시간 봤을 터인데도 사무실로 들어서는 H 님이 기억이 났다. 모습은 전보다 초췌했다. 세월이 흘러서이기도 하겠지만, 한겨울 차림치고는 얇은 검은색 겉옷에 양말도 신지 않은 차림으로 눈을 감고 찌푸린 채 서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주의를 끌기 위해 실무자를 기억하시겠냐고 부러 크게 인사하니 그제야 눈을 뜨고는 “아, 예~”라고 짧은 반응을 보이고는 상담실로 들어갔다.
일시보호시설에서 나간 이후 어떻게 생활을 꾸려왔는지 물어보니 월세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고 한다. 그러다 작년 10월경부터는 찜질방에서 지내기도 하고, 역 근처의 조용하고 안전해 보이는 장소를 찾아서 자기도 하고, 때로는 지인의 집에서 며칠 신세를 지기도 했다고 한다. 예전에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러 왔을 때는 여행 가이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시설을 이용하고 나간 이후 7년이 넘도록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 아마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제는 지인의 형편도 어려워 자신을 도울 수 없고, 부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오히려 자신이 부양을 해야 할 상황이란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하면서 혼자 생활하고 싶다고 했다.
H 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하는 것이야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상황을 보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녀는 상담하는 중에도 거의 눈을 감고 대답했으며 사이사이 혼잣말을 했다. 상담이 끝나고 방을 안내하는데 계단에서 몇 번이나 혼잣말을 하며 멈춰 서 있고 가시자고 해도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 방에 가서도 종일 앉아서 혼잣말을 한다.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이동하는 사이 계단에 서서 눈을 감고 중얼거리는 행동을 하고, 배식대 앞에서도 그러했다. 한번은 집게를 집더니 눈을 감고 음식을 담기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환기시킨 적도 있다. 그러고 보니 내가 7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녀의 이름이 낯설지 않고 얼굴도 기억났던 건 과거에도 비슷했던 그녀의 행동 때문이었던 듯하다.
단체 생활의 답답함, 그 이상의 고단함
몇 년 만에 재이용하러 온 H 님은 당장 그날 밤부터 때때로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고성을 질렀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셨냐 하면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거나 내가 그랬냐는 반응을 보였다. 어떨 때는 가슴을 부여잡고 악을 쓰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앞에서 보고 나서 그녀의 행동을 설명해주고, 진료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지만 절대 수긍하지 않았다. 간곡하게 정신과 진료를 얘기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소리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정 그럴 심정이라면 시설 외부에 가서 푸시라고, 다른 이용인들과 옆집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H 님이 시설을 재이용하는 3주 사이에 같은 층, 같은 방을 이용했던 다른 두 분이 그녀 때문에 시설을 나갔다. 한 분은 장애인 그룹홈 입소 상담을 마치고 방이 비길 기다리는 동안 일시보호시설 이용이 필요했던 분이고, 한 분은 수년째 서울역 근처에서 길거리 노숙을 반복하던 분이었다. 두 분 모두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아는지라 H 님과 열심히 상담 중이니 조금만 참아 달라고 했지만, 두 분의 인내심에만 호소해서 될 일이 아니긴 했다. 거리 노숙의 고통과 위험함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이들이 안전한 잠자리와 식사가 가능하고, 재활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연계가 되는 시설에 왜 가지 않느냐 묻는다. 그리고 시설 생활이 답답하다거나 단체 생활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분석들을 한다. 맞다. 그런 면이 있다. 어쩌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은 ‘답답함’이나 ‘단체 생활’이라는 짧은 말이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이상의 고단함과 애로를 견디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소개
김진미
여성 홈리스 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 소장.
글. 김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