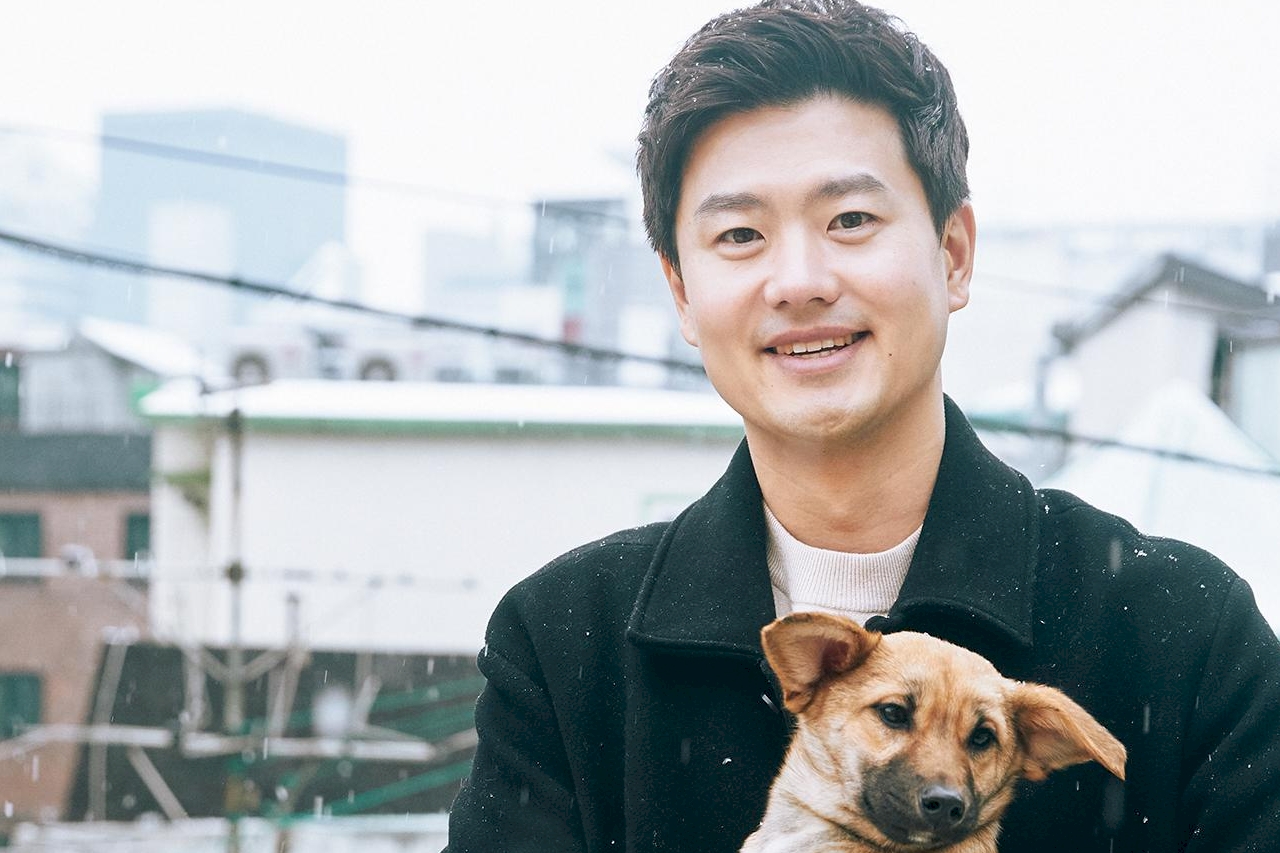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된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젊은 시절부터 강제징용 조선인 피해자, 원폭 피해 조선인 등 일제강점기 조선인으로서 고통받은 이들의 삶을 글과 영화로 담아온 박수남 감독과 그의 딸 박마의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다. 2월 15일에 열리는 베를린국제영화제의 ‘포럼 스페셜’에 초청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두 감독에게 오래된 깡통 속 50시간이 넘는 16mm 필름을 디지털화한 이야기, 우리가 침략의 역사와 그 속에서 살아간 조선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들었다.

©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스틸
재일 조선인 2세인 박수남 감독은 젊은 시절부터 일본에서 작가로 활동했다. 특히 ‘고마쓰가와 사건’으로 알려진 고마쓰가와 지역 여학생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된 재일 조선인 이진우와의 옥중 서신을 담은 <죄와 죽음과 사랑과>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줬다. 그는 이를 계기로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그들의 역사를 담아내는 영화감독이자 운동가로 살아왔다. <또 하나의 히로시마–아리랑의 노래>(1986), <아리랑의 노래–오키나와에서의 증언>(1991), <침묵>(2016) 등, 한결같이 일제강점기와 그 역사의 희생자인 재일 조선인의 이야기를 담아온 다큐멘터리스트. 그의 딸이자 <되살아나는 목소리>의 프로듀서인 박마의 감독은 동료로서, 가족으로서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제국주의 침략 역사와 재일 조선인 3세로서 마주하는 삶을 체감해왔다.
<되살아나는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 작가이자 역사 기록가로 활동한 박수남 감독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좋아한 노래, ‘마의태자’에서 딴 이름을 가진 박마의 감독은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틴케이스 속 엄청난 양의 필름을 디지털로 복원한다. 창고에 미처 영화화되지 않은 채 쌓여 있던 필름에는 일제강점기에 삶과 삶의 터전을 잃은 조선인들의 목소리가 빼곡이 담겨 있었다. 그 목소리가 잠들지 않도록, 시력이 약화된 어머니를 대신해 박마의 감독이 프로듀서로 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동시에 등장인물로 출연했다.
<되살아나는 목소리>가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면서 국제 관객을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박수남 감독은 “많은 이들이 복잡한 역사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면서도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영화가 공개되는 것이 매우 기쁘고, 베를린에서 상영한다는 점은 큰 의의를 가집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마의 감독 역시 “베를린국제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입니다. 각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대돼요.”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그의 말대로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한국 영화도 아니고 일본 영화도 아닌, 자이니치(재일 조선인) 영화”다. 국제 무대에서 일본인이나 한국인이 아닌 이들이 어떤 시각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받아들일지가 현재 두 감독에겐 초미의 관심사. 특히 <되살아나는 목소리>를 통해 오갈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한다.
오래된 필름과 목소리, 그리고 현재
300개가 넘는 오래된 필름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필연적이었다. 필름이 부식되기 전, 역사의 증인인 재일 조선인들의 목소리를 되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흩어진 필름과 음성 테이프 수록본을 합하는 작업은 오래된 필름과 나누는 대화이자 두 모녀 감독의 대화였다. 박마의 감독이 어리던 시절, 역동적으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필름 속 박수남 감독은 재일 조선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눈물을 흘리는 재일 조선인의 손을 잡은 채 설득하고 보듬는다. 박마의 감독은 젊은 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하고 복원한다.
필름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박마의 감독은 말한다. “어머니가 촬영한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모든 필름을 복원하기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우선순위를 상의하면서 필름을 되살렸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입은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온 원동력은 이 역사를 알리고 남겨야 한다는 의지였다.

©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스틸
역사의 아픔 속 되살려야 할 것들
박수남 감독이 오랜 세월 비극적 역사의 피해자인 재일 조선인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대상과 감독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해요. 자신의 아픔을 완전한 타인에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찍는 대상과 촬영하는 사람이 신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박수남 감독. 그는 또한 재일 조선인들의 “침묵이 깊었다.”라고 표현했다. 박마의 감독은 어머니가 히로시마 원폭 피해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빈민가에서 함께 머물렀다고 회상한다. “실업자가 간단한 노무를 하고 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재일 조선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특히 일본의 침략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일본인들이 있었기에 어머니의 영화제작이 가능했다고 말하는 박마의 감독. 제작조차 어려웠던 환경에서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알릴 힘은 목소리를 들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박수남 감독의 전작 <또 하나의 히로시마–아리랑의 노래>의 경우 10만 명, <아리랑의 노래–오키나와에서의 증언>은 20만 명이 관람했다. 상업영화가 아니기에 공동체 상영 형태로, 입소문으로 확산된 작품들이다. 이 영화들은 침략의 역사와 그 희생자들을 기억하려는 이들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고 박마의 감독은 말한다. 재일 조선인 2세, 3세로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목격해온 두 감독은 침략의 역사를 과거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일본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자, 재일 조선인의 역사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건 역사에 책임을 지는 일이에요.”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재일 조선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그것을 굳건한 의지로 추적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글. 황소연 | 사진제공. 시네마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