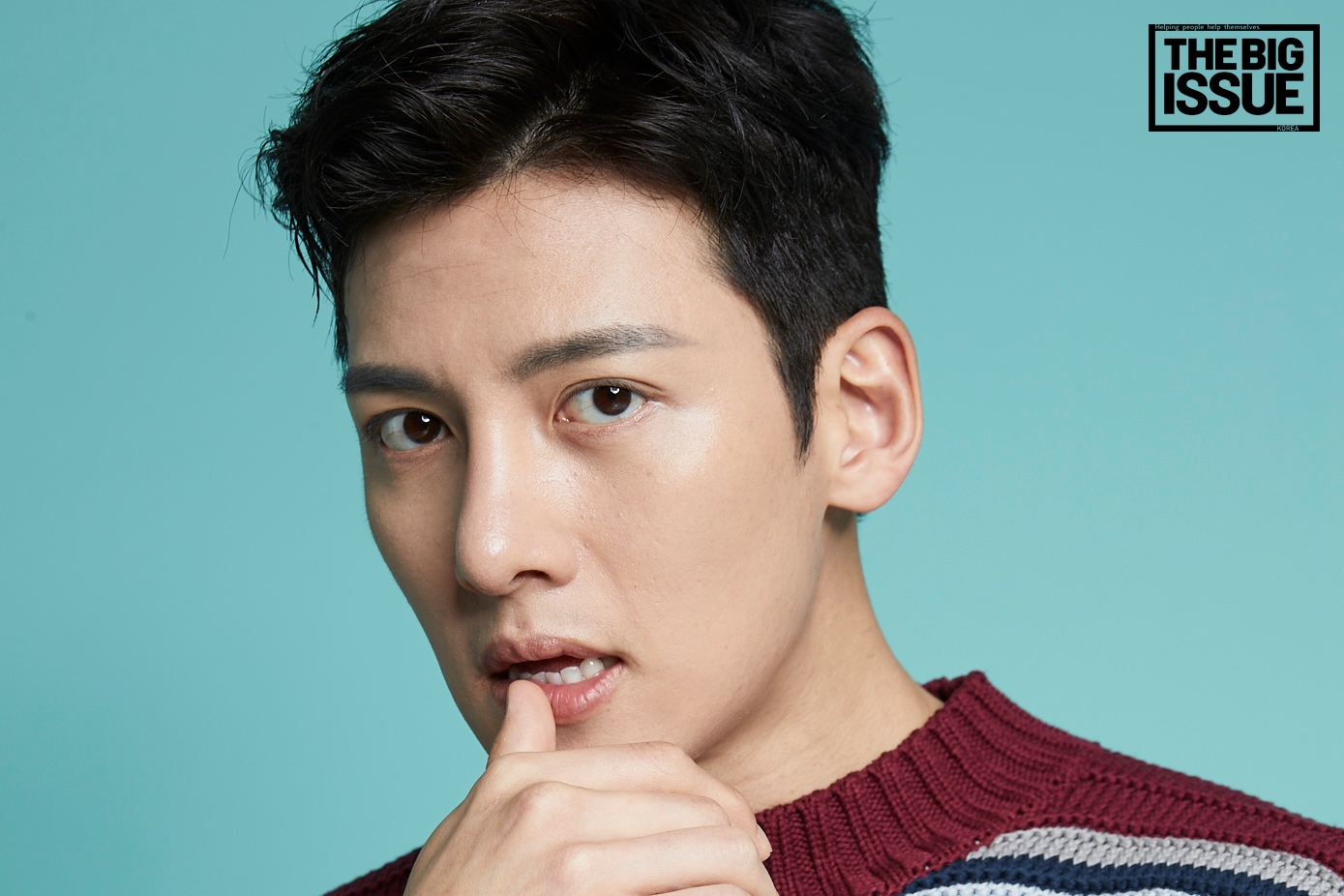우리는 누군가의 시공간을 침해하면서 어른이 됐다. 여전히 힘 있는 어른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의 시공간을 임의로 강탈하면서 자기를 유지한다. 왜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권리를 주장하는 걸까? 그래도 되니까 그럴 것이다. 나 역시 양육의 책임을 나누지 않는 어른(배우자)에게 가야 할 원망이 애꿎은 아이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곤 했으니까.
-은유, <다가오는 말들>중에서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심지어 목소리도 큰) 어르신들, 영화관에서 틈날 때마다 핸드폰 화면을 번쩍이는 반딧불이 인간들, 카페가 자기 집인 것처럼 과한 애정 행각 을 벌이는 연인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류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 일상에서 스치는 이들은 눈 한 번 찌푸리거나 싫은 소리 한 번 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일터에서 이런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난감해진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니까 애정 표현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겠어요?” “스피커폰은 꺼주세요. 주변 분들을 위해 이어폰을 끼고 통 화하시거나, 목소리를 낮추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도 금연 구역이라고 스티커 붙어 있죠? 흡연은 밖 에서 하세요.” “가정용 생활 쓰레기는 집에서 버리세요.”
카페에서 일할 때, 하루에 몇 번이고 다 큰 성인들을 제재 해야 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역으로 무례하다고 욕도 많이 먹었다. 소위 ‘진상’이라 불리는 이들의 99%는 성인이었다. 사회화가 덜 된, 예의범절을 갖추지 못한 어른들을 대하는 건 어렵고 껄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을 제재 한 적은 있어도 사람들을 특정해서 출입을 거부한 적은 없다. 인상만으로, 성별만으로, 나이만으로 “당신은 곧 소란을 피우고 민폐를 끼칠 사람 같으니 출입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건 불가능하다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몇 년 사이에 사회 분위기가 변했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는 이름으로, 소음과 불편을 유발하는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장소가 늘어나고 있다. 구글 지도에 표시된 노키즈존 매장 수만 해도 400개가 넘는다. 주변에도 노키즈존을 반기는 이들이 많다.
처음엔 안전사고 때문이라 생각했다. 2014년, 한 아이가 무 방비한 상태로 뜨거운 국을 들고 뛰어다니다가 한 여성과 부딪혀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은 후로 노키즈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이와 아이를 통제하지 못한 부모의 잘못임에도 배상 책임이 업소에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노키즈존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과 부모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말에 설득당했다. 하지만 (일부러 찾아다니진 않지만) 노키즈존을 방문할 때마다, 노키즈존은 안전이 아닌 어른의 편의를 위한 차별이라는 의구심이 짙어진다. 모든 노키즈존이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었다.

영화 <아기와 나> 스틸

영화 <아기와 나> 스틸
인증 샷을 건지기 위한 끝없는 카메라 셔터 소리, 욕을 빼 면 남는 단어가 몇 되지 않는 대화, 술 한잔 걸친 어르신들 의 고성, 고막을 강타하는 화통한 웃음과 박수 소리, 쇼핑몰 촬영을 하는지 전문 장비까지 갖춘 이들, 화장실을 이용하곤 용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누군가까지. 노키즈존에 서 어른들이 발생시킨 소음과 불편을 마주했다. 이렇게 어른은 서로가 서로의 시공간을 침범함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드나드는 공간을 아이들은 ‘노키즈존’이라는 이름에 막혀 출입할 수 없다. 문제 발생 시 이용을 제한한다고 고지 하는 등의 다른 노력 없이, 오직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 부터 차단하는게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 보호 구역과 노키즈존이 같은 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애초에 특정 계층의 공간 출입을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차별과 불평등임을 우리의 역사가 보여준다. 휠체어 장애인은 여전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백인과 흑인의 인종 분리 정책 까지도 예로 들 수 있다. ‘노키즈존’에서 ‘키즈’를 아시안, 한국인, 남성, 여성으로 바꾼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이라는 비판을 들을 테다. 하지만 동시대에 당당히 노키즈존을 외치며 차별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은 항변할 힘이 없고 배제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어른은 아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고, 혐오하기 쉽고, 무시할 수 있다. 정작 당사자들은 거부 대상이 되는 것조차 모르거나, 목소리를 낸다 해도 묵살당하기 쉽다.
누구나 자라면 어른이 된다. 하지만 제대로 사회화하지 못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무례하다. 공공장소에서 왜 뛰지 말아야 하는지, 큰 소리로 짜증을 내거나 울지 말아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할 수 있는 행동의 경계를 아이들은 그 나이에 체득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 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기 어렵다는 걸, 말 못 하는 아이들이 내지르는 소리는 자연스러운 소음이라는 걸. 왜 우리가 어른이고 아이는 아이인지 그 차이를 알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함께 사회화되어야 한다.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게 어른의 몫이다. 기저귀 교환대 없는 화장실에서 부모들은 대체 어떻게 기저귀를 갈아야 할까. 수유실이 없을 땐 어디서 수유를 해야 할까. 아이와 부모의 잘못임에도 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낄땐 국민 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모으고,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아이의 잘못을 방관하는 부모를 교육하고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도 어른과 사회가 할 일이다. 그 화살이 섣불리 아이들에게 향해선 안 된다. 지난 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걸 시작할 수 있는 사람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도 결국 어른이다.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사회가 올까봐 두렵다. ‘노OO존’이 하나씩 생겨날 때마다 나 또한 언제 어떤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노키즈존의 규제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먼 훗날 특정 나이대의 노인을 배제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런 미래 사회를 꿈꾸는지 묻고 싶다. 아이, 성소수자, 장애인 등 나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고 혐오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울 기회를 빼앗거나, 배척당한 아이들 자리에서 편의를 누리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타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대신 관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ditor 문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