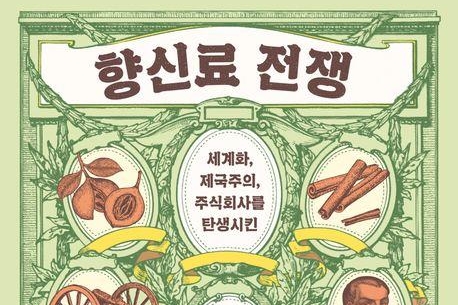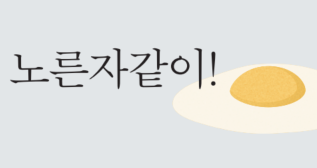
글. 김채옥
* ‘사단법인 오늘은’에는 아트퍼스트 에세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챙김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매주 글을 쓰고 나누며 얻은 정서적 위로를, 자기 이야기로 꾹꾹 눌러 담은 이 글을 통해 또 다른 대중과 나누고자 합니다.
1년 남짓 한집에서 동고동락한 룸메이트가 있다. 대학에서 처음 만난 우리는 학교 수업부터 공모전을 비롯한 각종 프로젝트에, 취미를 공유하는 소모임, 종종 여행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스며들듯 서로의 옆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 주변에서 밤을 잘 못 새우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곤 했는데(타지로 놀러 가서도 혼자 일찍 잠들어버려 한 소리씩 듣는 편이다.) 룸메이트와 함께라면 야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날에도 새벽까지 재잘재잘 떠들 수 있었다. 친구가 고향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 “그럼, 여기서 취업 준비할래?”라고 제안을 했고 그녀가 승낙을 하면서 지금의 관계로 발전했다.
어느 날 룸메이트가 회사 동료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며 들려주었다.
“○○님은 ‘겉따속차(겉은 따뜻한데 속은 차가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뭔가 친해지는 건 쉬운데 곁을 잘 내어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친한 친구들이 보이는데 저희는 아직 그 정도 사이는 안 된 것 같아요.”
그 대화를 듣던 다른 동료가 “아, 비유하자면 달걀프라이인데 우리는 노른자가 아니라 흰자라는 거죠?”라고 말하며 우리는 언제 ○○님의 노른자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 귀여운 대화에 미소가 절로 나왔다.
“네가 차갑다고? 너 회사에서 제법 벽치고 다녔나 봐?”
“아니? 내가? 전혀!”
“야, 근데 뭔가 귀엽다. 동료들이 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인간관계를 흰자와 노른자에 비유한 것도 재밌었지만 무엇보다 룸메이트를 향한 동료들의 애정 어린 마음이 느껴져서 흐뭇했다. 그건 내 룸메이트가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기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어디쯤일까 하고 생각해보게 된다. 그 동료들이 만든 공식에 나를 대입해보니 “나는 이미 너무 너의 노른자임을 깨달아버렸어.”라는 말이 자연히 따라왔다. 룸메이트는 내 쪽으로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음기를 쏙 빼고서는 의문스럽다는 표정으로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네가 노른자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라고 반박했다. 나는 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다며 능청스레 답했고 우리의 대화는 몇 차례 더 서로의 의견을 부정하다가 룸메이트의 “재수 없어.”라는 새침한 한마디와 나의 깔깔대는 웃음으로 끝났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
문득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듣던 말이 떠올랐다. “채옥이는 우리랑 노는 게 재미없나 봐.” 별말 아닌 그 말이 은근한 생채기로 내 마음에 남았었다. 지금도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렵고 어색할 때가 있지만 그때는 더 서투르고 미숙했다. 유머 코드도 성향도 관심사도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가끔 나만 못 어울리는 것 같은 묘한 이질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나름대로는 재미있지 않아도 애써 웃으며 삐걱거리는 자신을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저런 말이 들릴 때마다 그 이질감이 나만의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만 깨달았다.
그때 우리는 한날 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와 ‘그들’ 사이에는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았다. 넘기 힘든 벽 같은 것. 그래, 나는 그 아이들에게서 나를 흰자 같은 존재로 여겼다. 잘 지내고 싶어서 툭- 던진 표현에 내가 기대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맞춰주지 못할 때 나는 노른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흰자- 가끔은 차마 프라이팬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달걀 껍데기 속에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그런 흰자가 되곤 했다.
그러나 정말로 그랬을까? 나는 흰자이기만 했을까?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쳐보다 물음이 생겼다. 그 아이들과의 귀엽고 풋풋했던 추억을 보면서, 서로를 많이 생각했던 순간을 읽으면서. 몇몇 이야기는 참 다정해서 나를 마냥 흰자로 속단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어쩌면 나에게 다가온 작은 균열에 집중하느라 누군가에게 이미 노른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처 보지 못했을지 모른다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
룸메이트와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은 이유는 아마도 내가 의심하거나 긴가민가하는 일 없이 누군가에게 노른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겠지. 심지어 몇 번이나 아니라고 말해도 확실하게 “아니? 난 너의 노른자야.”라고 못 박았으니!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도 이런 관계가 탄생했구나. 어떤 안도감을 느끼게 되면서 기뻤겠지. 이런 걸 알려준 룸메이트에게 고마웠다.
룸메이트가 내게 주었던 것처럼, 나도 소중한 누군가(룸메이트 포함)에게 ‘너는 나에게 노른자 같은 사람이야.’라고 부지런히 알려줘야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또 한편으로는 찾아봐야지.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노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그래 노른자같이! 다짐, 또 다짐해본다.
김채옥
앞으로 좀 더 다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도 다정한 사람이 좋거든요.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