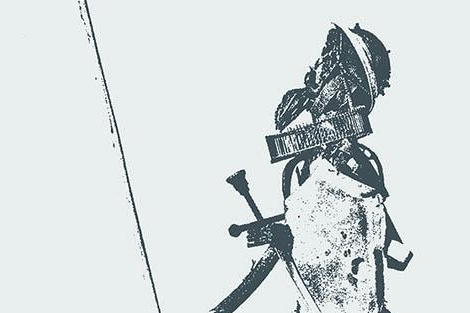글. 김보민
서울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 흐른다. 노들섬, 밤섬, 선유도, 여의도 등 크고 작은 섬을 품고 있으며 반포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여러 다리를 연결하는 494km의 길고 폭 넓은 강이. 고향인 강릉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 온 후 새롭게 생긴 취미는 따릉이를 타는 일이었다. 어느 곳에서든 쉽게 빌릴 수 있어 마트에 갈 때도,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퇴근길에 날씨가 좋을 때면 오래 걸리더라도 따릉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기도 했다.
버스와 지하철만을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여기던 나였는데 따릉이를 타기 시작하고는 활동 반경이 더 넓어졌다. 먼저 내가 사는 종로구 일대를 돌아다녔고, 이후로는 직장인 강남 근처로, 그러다 한강을 다니기 시작했다. 성수대교, 반포대교, 양화대교 등 낯설었던 한강 다리 이름들을 내 두 다리로 직접 마주하는 경험이 새롭고 즐거웠다.
밤공기가 좋았던 여름날, 동네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뚝섬한강공원에 간 적이 있다. 이사한 동네에서 한강을 가본 적은 없었기에 친구에게 뚝섬한강공원 가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친구는 이렇게 말했었다. “자전거 길을 쭉 따라가다가 작은 다리를 건너고 다시 큰 강이 오른쪽으로 보이면, 그게 한강이야.”
친구 말대로 자전거도로를 따라가니 정말 오른쪽에 큰 강이 있었고, 한강을 알리는 표지판을 만날 수 있었다. 하나, 둘 캄캄한 밤을 준비하는 빛이 켜지면서 등 뒤로는 서서히 붉어지는 노을이 그 자리를 지켰다. 노을이 모든 빛을 삼켜가고 있는 그때, 붉어지는 강을 보며 한강을 향해 다리를 재빠르게 움직였다. 숨이 가빠질 무렵, 마침내 뚝섬한강공원에 도착했다. 친구들과 자전거를 내려놓고 계단에 걸터앉았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강물의 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다. 한강을 가득 채워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눈으로만 담기 아까워 카메라 셔터를 여러 번 눌렀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아름다움을 담을 수 없어 아쉬웠다. 노을이 생명을 다하고, 어두운 밤이 나타났다.
애정의 한마디 말
서울의 밤은 ‘한강’으로 압축될 수 있다. 열대야를 피해 온 늦더위 피서객들, 강아지와 산책을 나온 가족들, 나 홀로 혹은 여러 명이서 무리 지어 달리는 사람들, 수많은 불빛이 가득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다정한 연인까지. 한강에 가면 한껏 여유가 느껴진다. 복잡하고 빠르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는 서울에도, 잠시 여유를 선물하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한강일 것이다.
잔잔하지만 불투명해 속을 알 수 없는 낮과 다르게 밤에 마주하는 한강은 서울의 모든 빛을 머금고 있다. 어떤 불빛이든 다 담아줄 수 있다는 한강의 너그러움에 빠져든다. 호수같이 잔잔한 중심부와는 달리 땅과 마주하는 곳에서는 작은 파도가 친다. 바람을 따라 잔잔히 그러나 끊임없이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바다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특히 밤에 보는 한강은 마치 큰 바다와 같이 불빛과 물결이 어우러지며 서울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밤의 한강을 보고 있으면 푸르른 바다는 아니지만 잠시나마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햇살이 좋던 가을날, 친구와의 약속을 마치고 집에 따릉이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다. 약속 장소였던 노량진부터 노들섬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보통 이어폰을 끼고 다니기에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듣지 못하고 대충 고개를 끄덕거린 후 앞을 향해 페달을 저었다. 그러다 큰 오르막길을 만나고 말았다. 경사가 높아 자전거를 타기에 무리였다. 결국 나는 자전거에서 내려와 손잡이를 끌며 힘겹게 올라가야 했고 입고 있던 티셔츠는 흘러내린 땀으로 축축해졌다. 그때 아까 만난 그 외국인이 다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내가 말했죠? 오르막길이라고?”
그는 웃으며 능숙한 한국어로 말했다. 그제야 그가 아까 내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됐다. 가던 길로 가면 오르막길이 나오니 길을 건너가라는 따뜻한 충고를 제대로 듣지 못한 나는 힘겨운 길을 만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 근처 지리를 잘 아는 것 같아 내친김에 노들섬 가는 방향을 물어보았다. 그는 친절하게 가는 방향을 알려주며 조심히 타라는 따뜻한 인사까지 잊지 않았다. 가끔 노들섬 근처를 지날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올라 혼자 슬며시 웃음 짓게 된다.
한강은 복잡한 도시를 뚫고 자유를 선사하는 공간이고, 따릉이는 그 세계를 잇는 도구다. 일상이지만 일상이 아닌, 이를테면 작은 여행에 가까운 이 행위는 나에게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선물해준다. 자전거를 타기 어려운 겨울이 되면 특히 한강을 따라 페달을 밟을 때 느꼈던 여유와 즐거움에 대해 자주 생각하며 그리워한다. 나는 따릉이를 타며 발견한 이 작은 행복을, 서울의 한강에서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이다.
‘사단법인 오늘은’의 아트퍼스트 에세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챙김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매주 글을 쓰고 나누며 얻은 정서적 위로를, 자기 이야기로 꾹꾹 눌러 담은 이 글을 통해 또 다른 대중과 나누고자 합니다.
김보민
아직 만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애틋함을 갖고 있습니다. 늘 따스한 온기를 지닌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email protected]